
랍비 문헌과 신약성서 (Rabbinic literature and the New Testament)
들어가는 말
1. 랍비 문헌의 서론
미쉬나
토세프타
탈무드
미드라쉬
탈굼
2. 신약과 랍비 저술 (The New Testament and Rabbinic Writings)
예수의 성전에서의 행동
바울의 우상에 관한 교훈
나가는 말: 신약학을 위한 추론

브루스 칠턴 (Bruce Chilton)
들어가는 말
랍비 문학은 서기 70년 성전이 파괴된 후 이스라엘 종교의 지배적인 형태로서 랍비 유대교가 등장하면서 생겨났다. 그 때까지는 랍비 문학의 배후에 있던 구전 (oral traditions)의 기본 틀을 형성하였던 집단에 속한 교사들이 다른 집단들 - 제사장, 묵시적 교사들, 철학적 저자들, 분리주의자들-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신앙과 실천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다투고 있었다. 신약에서 바리새파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아마도 랍비운동을 전개하였던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포함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현자로 여기고, 교사로서의 지위를 반영한 '랍비'라는 공통 호칭을 사용했는데, 이 호칭은 교사로서 자신들의 신분을 반영했다. 바로 이점에 있어서, 랍비라는 호칭은 보통 사람들보다는 출중하다는 뜻에서 알려지게된 원인이 되었다. 물론 나사렛 예수와 같은 많은 교사들이 바리새파나 바리새파 신학을 특징짓는 주장들의 주창자들은 아니었다.

his illumination from the fourteenth-century Sarajevo Haggada pictures Rabban Gamliel. The picture may be of Rabban Gamliel II, grandson of the Rabban Gamliel who was the Apostle Paul’s teacher. The younger Gamliel, unlike his grandfather, was known for his severe dispos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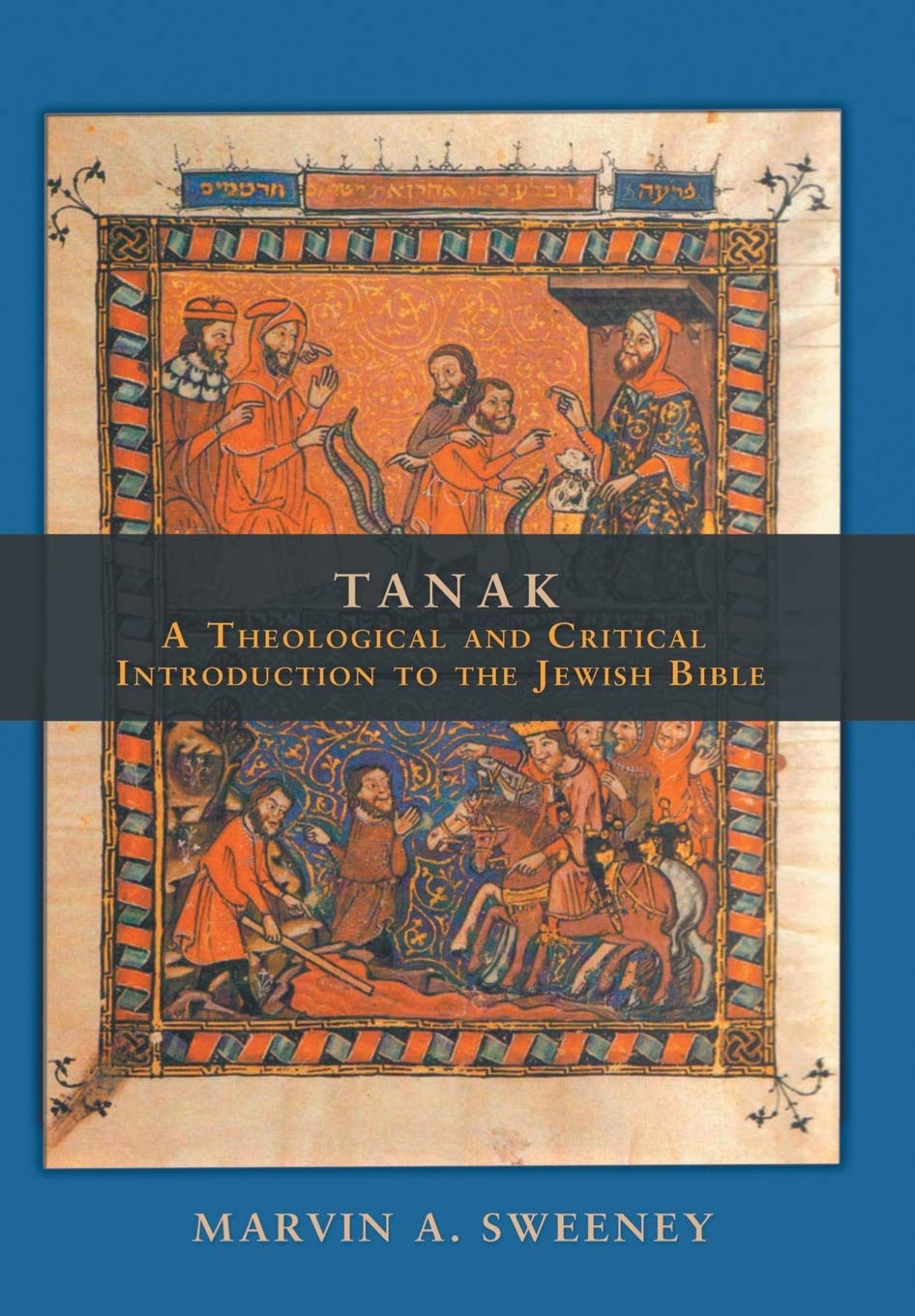
1. 랍비 문헌의 서론
서기 6세기까지의 랍비 저술들은 성경과 함께 현인들의 생각 속에 토라를 구성했다. (Bruce Chilton Comparisive Handbook, Jacob Neusner). 토라는 기록되었지만, 또한 구전으로도 세심하게 형태를 갖추었고 전수되었다. 현자의 문헌은 이러한 구전 전통을 대변한다. 서기D 200년에 이르기까지, 랍비들은 토라에 대한 다소 복잡하지만 정교한 이해를 발전시켜왔다. 즉 그들은 시내산에서 모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구전 율법의 전승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발전되었다고 말한다. 그들의 권위적인 해석은 자신들 중심으로 형성된 유대교 (랍비 유대교)가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 멸망 이후에도 생존하고 조정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히브리 성경에서 예배가 일종의 자명한 이치가 되어왔던 유대교에서 성전 멸망은, '제사가 없이도 어떻게 야웨를 섬길 수 있을까?'란 논점을 제기하였고, 이는 유대교의 생존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였다. 또한 주후 70년 이후에 유대교는 기존 시스템의 붕괴라는 치명적인 변화에 종종 노출되었기에, 이러한 상황에 조정될 필요가 있었다. 랍비들은 자신들이 토라의 권위적인 해석을 통하여 이러한 난국을 돌파하고 유대교가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본다. 랍비들은 자신들이 말하였 이해에 근거하여 토라를 가르쳤고, 토라를 본보기를 들어서 논증하였다. 비록 그들의 활동이 결코 형식적인 주석에만 국한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쭉, 성경 즉 타나크 (Tanak: Torah [율법], Nebi’im [예언서], Ketubim [성문서]의 약어)와 빈번하게 소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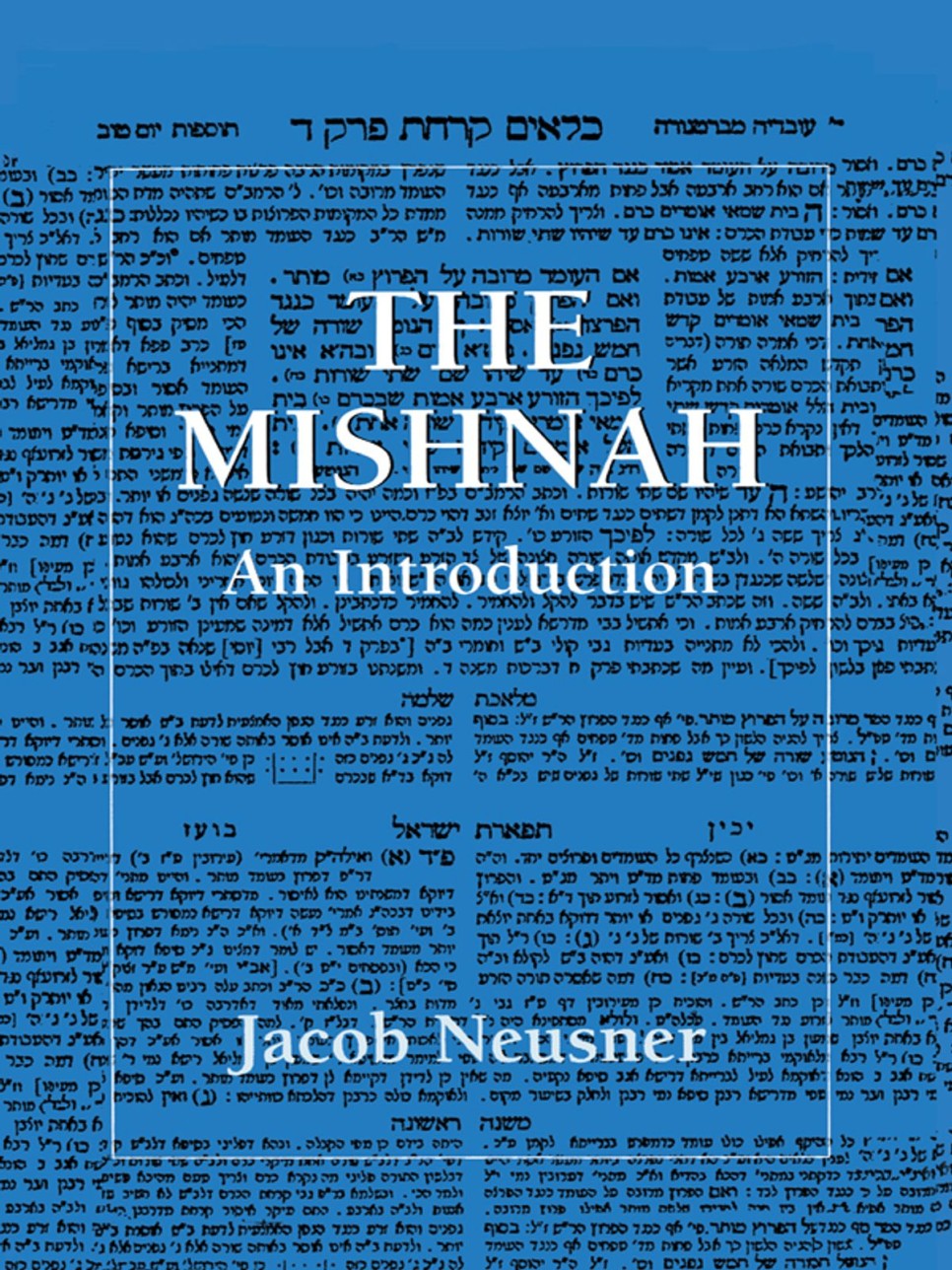
미쉬나
로마인들에 의해 팔레스타인에서 유대를 대표하는 권위를 가진 이로 임명된 족장 유다 (Judah the Patriarch)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랍비들의 미샤나요트( mi?n?yot: 탄나임 [히브리어 tann??im "반복자들"]의 "반복된 가르침들")를 함께 묶어서 미쉬나를 탄생시켰는데, 미쉬나는 랍비 문학의 첫 문서이다. 그는 이들 법률 자료를 63개의 논고 (tractate)로 조직하였고, 여섯 가지 주요 범주 집단으로 편성하였다:
농산물의 십일조 (Zera?im )
식사 (Moed)
여성과 결혼 (Nashim )
타인의 권리 침해 (Neziqin)
성전에서의 희생제사 (Qoda?im)
제의적 정결( ?oharot).

Mishnah - Wikipedia
Mishnah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The Mishnah or Mishna ( / ? m ? ? n ? / ; Hebrew : ???????? , "study by repetition", from the verb shanah ??? , or "to study and review", also "secondary") [1] is the first major written collection of the Jewish oral traditions known as the Oral Torah . ...
en.wikipedia.org
구전 토라를 이렇게 기록하여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것은 버리고 본질적인 내용들을 농축시켜 놓았다. 여기에는 성전과 관련된 규정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성전을 재건하려는 어떠한 희망도 주후 135년 바르 코크바 반란의 실패로 인해 소멸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세 율법의 상당한 분량이 성전 제의를 다루고 있기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법적인 전승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때는 반드시 다루어야 할 내용이었다. 사실상 희생 제사법에 대한 명상과 토론이 희생제사의 자리를 대체했다.

AD 70년 이후의 상황에 대한 이러한 조정은 지상의 어떤 조건이 주어진다고 해도 모세의 토라는 하늘에서는 영원하고 불멸하다는 랍비적 확신을 점점 더 자라도록 하는 자양분이 되었다. 미쉬나의 주된 관심사는 할라카, 즉,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할 문제들에사 당연히 "걸어야 하는"(h?lak) '길'이다. 추가 논고인 아봇(?Abot. "조상들" 또는 "설립자들")은 추가적인 말씀들을 전달하며, 또 다른 논고, "랍비 나단에 따른 조상들" (Abot de Rabbi Nathan)은 이들 랍비 권위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Tosefta - Wikipedia
Tosefta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Not to be confused with Tosafot or Tosafists . The Tosefta ( Jewish Babylonian Aramaic : ?????? "supplement, addition") is a compilation of the Jewish oral law from the late 2nd century, the period of the Mishnah . Overview [ edit ] In many ways, the Tos...
en.wikipedia.org
토세프타
토세프타 (Tosefta)는 보충되는 말씀들을 편성한 글이다.아람어 단어 'tosept?'는 "부가"를 의미한다. 거의 미쉬나 전체를 중심으로 인용과 윤택, 이차적인 바구어 말하기, 자유자재한 보완으로 조직된, 토세프타 전체는 주후 300년경에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Talmud - Wikipedia
Talmud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This article is about the Babylonian Talmud. For the Jerusalem Talmud, see Jerusalem Talmud . "Talmudic" redirects here. "Talmudic Aramaic" refers to the Jewish Babylonian Aramaic as found in the Talmud. The Talmud ( / ? t ?ː l m ? d , - m ? d , ? t æ l -...
en.wikipedia.org
탈무드
두 탈무드(하나는 팔레스타인 탈무드, 다른 하나는 바벨론 탈무드)는 미쉬나를 보완하는 길을 택하는 대신, 미쉬나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주석들을 제공한다. 탈무드는 미쉬나를 기본 텍스트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중 토라 (즉, 성경 본문과 더불어 이에 상응하여 랍비들이 공포한 구전) 내에서 미쉬나의 지위가 무엇이든지 시도할 때마다 강화되었다.
비록 빈번하게 오해되기도하였지만, 이러한 탈무드의 변화된 움직임은 미쉬나에 구현된 구전 토라와 더불어 랍비 유대교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표시하려는 관심사를 대변한다. 독자들은 종종 기록된 히브리 성경에 대한 주석이 주요 논쟁점이라고 가정한다. 비록 성경이 탈무드에 빈번하게 그 특징적인 면모를 드러내지만, 전체적으로 랍비 문학 전반에 걸쳐서, 탈무드가 목표하는 바는 시내산에서 주어진 구전 토라인 미쉬나를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다.

보통 팔레스타인 탈무드로 알려진 이스라엘 땅의 탈무드는 주후 400년 경에 이르러서야 마감되었고, 대부분이 미쉬나의 처음 4가지 구분에 수록된 논고들에 대한 주석을 제공한다. 주후 600년경에 마감된 바벨론 탈무드는 미쉬나의 2-5 구분에 수록된 논고들에 대한 지속적인 주해를 제공한다. 팔레스타인의 탈무드는 미슈나의 첫 네 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으로 구성되며, 바벨론 탈무드는 식사, 여성, 권리 침해, 희생제사에 관한 해석을 제공한다. 이들 수집한 글들은 미쉬나에 표현된 동일하고 관련되는 자료들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표현하는데, 서로 다른 견해와 이질적인 시각 사이에 비교를 함께 제시한다. 탈무드의 대부분은 아람어로 쓰여졌지만, 그 일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 두 언어들이 있는 일부 요소들은 아주 오래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미쉬나와 탈무드가 신약보다 수세기 늦게 출현했고, 1세기에는 증거가 없는 구조와 개념을 가진 하나의 유대교를 그려내고 있다. 그러기에 미쉬나와 탈무드에서 도출된 작은 부분들만이 모세 율법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두고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 사이를 비교할 때에 유효적절한 자료가 된다. 중세에 이르게되면, 바벨론 탈무드는 랍비 유대교의 패러다임을 전형적으로 표현하는 문서 (전범)의 지위를 얻게되었다.

Midrash - Wikipedia
Midrash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This article is about the Jewish mode of biblical interpretation and related rabbinical texts. For the Islamic religious school, see Madrasah . Midrash is biblical exeges...
en.wikipedia.org
미드라쉬
기록된 토라에 대한 주석으로 기획된 측면에서 비교할 때에, 비록 두 가지 탈무드가 토세프타에 비해서 그런 측면이 결핍되어 있지만, 성경은 다른 장르의 문학 형식으로 지속적인 주석을 만들어내도록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바로 이것이 미드라시(복수. midrashim)이다. "미드라시(midrash)"라는 용어는 의미를 "찾아내는 것 (동사 d?ra?에서 파생)을 뜻한다. 한 가지 탁월한 수집록은 미쉬나에 기여하였던 탄나임 (Tannaim) 랍비들의 이름을 따서, 탄나임 미드라심이라고 불린다. 그렇지만 사실, 미드라쉬는 종종 연대가 후대이다. 3세기와 4세기를 편성된 기간으로 볼 수 있다. 미드라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출애굽기에 대한 두 가지 주석 -
메킬타 데 랍비 이스마엘 (Mekilta de Rabbi Ishmael )과 메킬타 (Mekilta)
레위기에 관한 한 가지 주석 - 시프라 (Sipra)
민수기와 신명기에 관한 주석 - 시프레 (Sipre)
이들 미드라쉬는 할라카로도 알려져 있다. 이는 실천적인 논점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쉬나처럼 체계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이들 미드라쉬는 미드라시 랍바 (Midrash Rabbah)만큼 두서없이 산만하지는 않다. 이 유명한 수집록은 3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발전된 글들이다. 내용은 모세오경과 더불어 회당에서 전례에 사용되는데 핵심적인 다른 성경들을 다루고 있다: 룻기과 에스더서, 애가 그리고 아가. 이들 책을 함께 묶어 보면, 서사, 강론, 주석, 그리고 신학적 가르침에 관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한다. 미드라쉬 랍바는 신념, 적절한 태도와 미덕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학가다 (haggadah) 풍으로로 알려져있고, 또는 랍비들의 구전 설화 (haggadah)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Targum - Wikipedia
Targum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This article is about the Aramaic translation of the Hebrew Bible. For other uses, see Targum (disambiguation) . The targumim (singular targum , Hebrew : ????? ; interpretation, translation, version) were originally spoken translations of the Jewish scrip...
en.wikipedia.org
탈굼
기록된 토라와 구전 토라의 관계는 또한 랍비 문학 내에서 탈굼 (targum)이란 장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탈굼"이라는 용어는 단지 아람어로 "번역"을 의미하지만,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옮겨서 표현하는 종류와 목적은 매우 다양했다.

아람어는 근동 지역에서 공통어 (lingua franca)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 아람어는 유대인 (나바테인과 팔미라인 같은 다른 민족에 의해서처럼)에 의해 채택되었고, 에스라와 다니엘서에 있는 히브리 성경의 아람어 부분은 기원전 2세기에 이르러서 유대교의 언어적 구성이 크게 변화했음을 입증한다. 믈론 아브라함은 아람인이었다. 물론 아브라함부터 2세기까지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아람어가 극적인 변형을 이루어왔었다. 짐작하건대 유대인이 아람어를 포용하는 데 열을 올린 한 가지 이유는 히브리인과 연계되어 있다는 머나 먼 기억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히브리어는 상당히 다른 언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주후 1세기까지, 아람어는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에서 공용어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독특한 방언으로 말하였다). 히브리어는 거주민들 가운데 교육을 받은(그리고/또는 아마도 민족주의적인) 계층에 의해 이해되었고, 그리스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친숙함은 특히 상업적, 관료적 집단에서는 문화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언어였다.

유대와 갈릴리의 언어적 상황은 대중적인 연구와 예배를 목적으로 히브리 성경이 아람어로 번역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 비록 쿰란에서 발견된 아람어 레위기와 아람어 욥기의 단편들이 기술적으로는 타굼 (즉, "번역")이지만, 문학적인 측면에서는 칼굼이란 장르를 사실상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이들 쿰란 문헌들은 합리적인 차원에서 볼 때, "문자적" 번안이다. 아람어 사본과 번안된 히브리어 사본 사이에는 형식적으로 서로 일치시키려는 시도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 다른 현존하는 탈굼들은 랍비 유대교 내에서 용의주도하게 감시를 받은 문서들로서, 전혀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탈굼 생산의 목표가 히브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감각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다른 언어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 (paraphrase)이 랍비 탈굼의 특징이다. 이론적으로 성경의 한 단락이 히브리어로 읽은 후에 번역자(m?turg?m?n)가 구두로 번안되어졌다. 회중이 해석을 원문으로 착각하지 않는 한, 해석자 ( m?turg?m?n)을 독자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cf. m.Meg. 4.4?10; b.Meg. 23b?25b). (탈굼을 배포하기 전에 읽을 수 있는 구절 수를 특정하는 규정은 아마도 신약 시대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게 번안은 원칙적으로 구두로 배포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중요한 학습 중심지들에서 전승들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고, 더나아가서 더 큰 덩어리로 뭉쳐지는 것이 가능해졌다. 더욱이 주후 70년 이후 유대교 내에서 지배적인 지도자로 랍비들이 부상한 것은 유대교가 랍비들을 중심으로 형사되는 경향을 띄도록 만들었는데, 이러한 중앙 집중이 없었다면, 문학적인 탈굼은 결코 생산되지 못했을 것이다.

Relief of Horemheb with interpreter and envoys. limestone Dimensions: 53 × 75 × 17 cm Period: New Empire; 18th Dynasty; Tutankhamun 1333-1323 BC Egypt, Egyptian.
수세기에 걸쳐 반전되고 전수된 탈굼은 타르굼은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기 (paraphrase)이다. 하지만 털굼이라는 장르를 통해 전달되는 신학적 프로그램들은 항상 일관되지는 않았는데, 심지어 하나의 타르굼 내에서도 조차도 초지일관하지 않다. 비록 랍비들이 탈굼 활동을 통제하려고 시도했지만, 현존하는 탈굼 그 자체는 때때로 랍비들의 사후 금지조치와 모순된다. 예를 들어, m. Meg. 4.9은 레위기 18:21 ("너는 결단코 너의 자녀 [씨앗]을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이 이방인과의 성적 결합과 관련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랍비의 권위가 확립된 지 한참 후에 제작된 후대의 작품인 탈굼 요나단 위서 (Targum Pseudo-Jonathan )는 단지 그 정도만을 취한다. 탈굼은 그러한 기이한 점들을 반드시 밝혀낸다. 왜냐하면 탈굼은 민속적 관습과 랍비적 영향력 사이에 일어나는 변증법적 상호작용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긴장감은 때로는 극적이고 창의적인 공상을 대단히 즐기거나, 해석을 둘러싼 갈등의 상호 작용, 해석 과정에 나타나는 즐거움 등을 통해 매개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광범위한 전수 기간 동안 더욱 풍부해졌다. 현존하는 탈굼들 각각은 주어진 계기에 따라 밟아온 그러한 복합적인 과정이 결정체를 이룬 것이다.

A side-by-side comparison of the Hebrew Bible, Targums Onkelos (Aramaic and English), Neofiti, and Pseudo-Jonathan, and the NIV (English). translation of Genesis 1:1. The red arrow points to the word ????? “b’hakmah” (Aramaic: “in/with wisdom”) in Neofiti’s Aramaic translation of Gen 1:1.
탈굼의 구분
토라 (모세오경) 탈굼
예언서 탈굼 (전기 예언서 [역사서]와 후기 예언서 [한글 성경에서 선지서라고 부르는 글들)
성문서 (Hagiographa) 탈굼
유대교에서 통상적으로 히브리 성경을 구분하는 방식과 같다.
히브리 성경 거의 전체가 탈굼으로 모두 합쳐서 번역되었지만, 아람어로 된 한 권의 포괄적인 성경을 생산하려는 의도를 나타낸 단 한 순간도, 특별한 움직임도 없었다. 탈굼은 생산된 지방과 목적 그리고 아람어 방언들에 따라 매우 복잡해서, 그 복합성을 해소하려고 해도 더 이상 불가능하다.

Targum Onkelos - Wikipedia
Targum Onkelos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Targum Onkelos (or Onqelos ), ????? ??????? , is the Jewish Aramaic targum ("translation") of the Torah , accepted as an authoritative translated text of the Five Books of Moses and thought to have been written in the early 2nd-century CE. Authors...
en.wikipedia.org
모세오경 탈굼들 중에 탈굼 온켈로스 (Targum Onqelos)는 번역에 대한 랍비적 이상에 가장 잘 부합하는 작품으로 보인다. 특히 하나님과 그의 계시를 적합하게 존칭을 사용하여 묘사하기 위해서, 맛소라 사본 (MT)의 히브리어 (그리고 추측컨대, 고대에 유통되는 히브리어 본문)에 일치하는 정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온켈로스의 방언은 통상적으로 "중기 아람어"라고 불리며, 이 방언은 기원전 1세기에서 주후 200년 사이의 탈굼에 사용되었다. 그렇지만 더 나은 명칭은 "과도기 아람어" (기원전 200년?주후 200년)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방언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통되던 아람어가 합의된 표준으로 받아들어지지 않게 되고, 그 이후 시대에 사용된 다양한 방언들 (하스모니안, 나바테안, 팔미라, 아르사키드, 에센, 그리고 탈굼)을 다 포괄하기 때문이다.
온겔로스 방언을 어어서 아람어 방언이 지역에 강하게 동화된 형태로 사용되었다. 이 방언을 지역 아람어 (Reginal Aramaic) (주후 200-700년)이라고 부르는 것이 논리적이다.

Targum Neofiti - Wikipedia
Targum Neofiti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Targum Neofiti (or Targum Neophyti ) is the largest of the Western Targumim on the Torah , or Palestinian Targumim. It consists of 450 folios covering all books of the Torah, with only a few damaged verses. More than a mere Aramaic translation of ...
en.wikipedia.org
타르굼 네오피티 1 (Targum Neofiti I)은 1949년 알레한드로 디에스 마초(Alejandro Diez Macho)에 의해 로마의 새 개종자(Neophytes) 도서관에서 발견되었다. 네오피티의 바꾸 표현하기는 온켈로스의 바꿔 표현하기와는 실질적으로 전혀 다르다. 전체 문단이 첨부되었다. 예를 들어, 첫번째 살인 사건(창 4:8) 이전에 가인과 아벨이 밭에서 말다툼을 벌어는 장면이다. 그러한 "번안"은 상당한 정도로 첨부된 내용이다. 언제 이러한 종류의 놀라운 자유를 마음껏 누렸는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네오피티의 방언을 옛 학계에서는 "팔레스타인 아람어"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온켈로스의 바벨론 아람어와 구별하기 위함이다. 네오피티는 지방 아람어 시대인 주후 200-700년 동안에 생산되었다. "팔레스타인"과 "바벨론" 사이의 구별은 우리가 언급하여왔던 아람어의 지역화를 명백하게 드러낸다. 그러나 네오피티는 노골적으로 지역 아람어로 제작되는 반면, 온켈로스는 지역적인 것이 되는 길에 있었던 과도기 아람어로 모습을 보이다. 네오피티가 다소 늦게 등장하긴 하지만, 두 타르굼의 연대기는 거의 같다; 그들 사이의 차이점은 연대보다는 프로그램이 더 많은 역할을 하였다. 온켈로스를 "우리의 탈굼"이라고 불렀던 바벨론 랍비들은 그들의 동료들이 서쪽에 미친 영향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바벨론에서 아람어로 번안하는 과정에 행사했다.

Targum Pseudo-Jonathan - Wikipedia
Targum Pseudo-Jonathan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Targum Pseudo-Jonathan is a western targum (translation) of the Torah (Pentateuch) from the land of Israel (as opposed to the eastern Babylonian Targum Onkelos ). Its correct title was originally Targum Yerushalmi (Jerusalem Targum), which...
en.wikipedia.org
네오피티에서 발견된 확장형 번안을 대변하는 최후의 작품은 탈굼 요나단 위서 (Targum Pseudo-Jonathan)이다. 창 21장 21절에서 모하메드의 아내와 딸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주후 7세기 이후의 어느 시간에 최종적인 편성을 하였다고 간주하도록 만든다. 이 탈굼은 이름이 매우 특이하게 지정되어 있는데, 중세 시대에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히브리 철자 요드(?) 하나로 약칭되었기 때문에, 편리하게 갖다 붙였다고 본다. 그러나 이 철자는 아마도 "예루살렘"을 의미했을 것이다. 물론 이 명칭이 도대체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아직도 비평 작업이 정립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요나단 위서 (Pseudo-Jonathan)라는 제목은 불확실성을 암묵적으로 인정한다.
?
네오피티와 요나단 위서는 사용된 방언과 해석 스타일이 온켈로스와 구별짓기 위해 다 함께 팔레스타인 탈굼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사실 요나단 위서는 아카데미 아람어 (주후 700?1500년) 시대가 동이 터 오를 때 생산되었다. 이 기간 동안 근동지역에서는 아랍어가 공용어로로서 아람어를 대체하여 왔던 이후에, 일종의 문학적 관용어로 이 언어를 랍비들이 계속하여 사용하며 발전시켜 왔다.

네오피티와 요나단 위서는 사이비 조나단은 다른 두 가지 탈굼, 즉 더 정확히 말하면 탈굼이라는 그룹에 결합되었다. 첫 번째 그룹은 연대순으로 카이로 게니자 (Cairo Geniza)에서 발견된 파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탈굼들은 좀 더 완벽한 작품들의 일부였다. 연대를 측정하면 7세기에서 11세기 사이에 생성되어, 원래 카이로의 구 회당 (Old Synagogue)에 부속되어 있던 게니자에 폐기되어 보관되어 있다가 발견되었다. 이들 탈굼의 해석 유형과 내용을 면밀하게 관찰하면, 이들 파편들 조각들은 팔레스타인 유형의 다른 탈굼과 비교할 만하다. 똑같은 유형의 탈굼을 '파편 탈굼' (Fragmentary Targum)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중세 동안에 여러가지 탈굼을 수집하여 읽으면서 모아놓은 것이다. 팔레스타인 탈굼에서 발겨되는 흥미로운 특징이 있다. 탈굼들 사이의 관계가 마치 복음서들 사이의 관계와 어떤 방식으로든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공관적 (synoptic)이라고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관 탈굼).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 탈굼에 속하는 네 종류 탈굼들 모두가 가인과 아벨 사이에 벌어진 논쟁을 전달하며, 공관복음 학도들에게 잘 알려진 대로 순서와 문구에 있어서 변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 모두가 단일한 수집록 속에 아람어로 현존하고 있다. 물론 수집록에 포함된 각 탈굼의 연대와 성격은 개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랍비 전승 (t. Meg. 3a)에 따르면, 전집 전체는 예수와 동시대에 살았던 유명한 랍비 힐렐 (Hillel)의 제자인 요나단 벤 웃시엘 (Jonathan ben Uzziel)에게서 유래하였다고 전한다. 다른 한편으로, 예언서 탈굼들에는 4세기 랍비인 요셉 바르 히야 (Joseph bar Hiyya)라는 이름으로 제시된 번안들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구절들이 있다 (참조. Isaiah Targum 5.17b; t. Pesa ? . 68a). 공교롭게도 이사야 탈굼 (예언서 탈굼들 중에 다른 어떠한 탈굼보다도 더 많이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은 두 가지 징후를 보이고 있다.
Tannaim - Wikipedia
Tannaim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Tannaim ( Aramaic : ????? ? [tana?(?)im] , singular ??? [ta?na] , Tanna "repeaters", "teachers" [1] ) were the rabbinic sages whose views are recorded in the Mishnah , from approximately 10-220 CE. The period of the Tannaim , also referred to as the Mish...
en.wikipedia.org
Amoraim - Wikipedia
Amoraim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Amoraim ( Aramaic : plural ??????? ?amora??im , singular Amora or Amoray ????? ?amo??a ; "those who say" or "those who speak over the people", or "spokesmen") [1] refers to Jewish scholars of the period from about 200 to 500 CE , who "said" or "told over...
en.wikipedia.org
한 가지 징후는 주후 70년 성전 파괴 직후에 유행하였던 민족주의적 종말론이고, 다른 하나는 약 3백년 후에 바빌론에서 더욱 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랍비들의 관점이다. 탈굼 요나단 전체는 랍비들이 해석을 수집하고 편집한 두 주요 시기의 결과인 것으로 보이는데, 제1시기는 탄나임 (?????. 주후 20-200년, '반복된 가르침') 시대이고, 제2시기는 아모라 (???????. 탄나임의 뒤를 이어서, 주후 3-6세기에 팔레스타인이나 바벨론에서 활약한 유대교 율법학자들의 총칭으로, "해석자"라는 뜻을 가진 용어이다)이다.

from Wikipedia
탈굼 요나단이 편성된 후, 아마도 (모세오경에 대한) 파편 탈굼이 조합된 무렵과 동일한 시간대에, 탈굼 부록 (addenda)이 필사본의 특정한 곳에 추가되었다. 이들 부록들은 코덱스 라우츨리니아누스 (Codex Reuchlinianus)와 Hebreu 75로 잘못 이름이 붙여진 프랑스 국립도서관 (French Bibliotheque Nationale)에 소장된 필사본으로 대변된다.

탈굼의 세 가지 범주 중에서 성문서 탈굼이 가장 다양하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비록 시편 탈굼은 형식적인 번역이지만, 어떤 점에서는 그 성격이 미드라쉬라고 보는 편이 더 좋은 묘사인 듯하다. 잠언 탈굼은 페시타 (시리아어 판본)를 상당히 직설적으로 번안한 듯이 보이며, 에스더 탈굼은 부림절 전례를 기념하기 위한 의도로 사용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 성문서 탈굼들은 근대적 시각으로 연구할 때에 가장 문제가 많은 부류이다. 하지만, 신약을 이해하기 위한 관점에서 볼 때에 탈굼을 분류하는 일반적인 범주들 중에 가장 관심을 작게 받기도 한다. 그 이유는 그 연대가 한참 후대의 것이기 때문이인데,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중세의 글이기도 하다.

2. 신약과 랍비 저술
(The New Testament and Rabbinic Writings)
신약 학계는 오랫동안 랍비문학이 신약 내에 기록된 사건들의 맥락과 의미를 밝혀줄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예수의 성전 행동과 바울의 우상에 대한 가르침 등을 들 수 있다. 유월절에 앞서 매년 반 세겔 성전세를 납부하기 위해 환전상들이 필요했다. 성전세로 바치는 두로산 세겔이 가장 순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 환전상들은 전 세계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여 속죄 의식에서 반드시 필요한 본질적인 역할을 했다. [이 사례와 토론은 원래 칠톤 (Chilton)의 "갈릴리 랍비"에 있는 내용이다. 이 논문은 The Temple of Jesus: His Sacrificial Program within a Cultural History of Sacrifice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2)와 Chilton 등이 쓴 Comparative Handbook에 수록된 주석에다 인류학적 분석을 보완하였다.]

El Greco, Christ Driving the Money Changers from the Temple, c1570.
Minneapolis Institute of Arts
예수의 성전에서의 행동
이들 환전상들은 순례자들이 가져온 동전을 받아서 두로산 반세겔로 환전하여 주었다. 반세겔은 죄의 용서를 위해 매일 바치는 모든 제물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들을 성전 뜰에서 쫓아낼 뚜렷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예수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다. 사고 파는 이들을 내쫓는 과정에서, 예수는 거룩한 희생제물을 방해하고 제의들을 무효로 취급하는 듯이 보일 수도 있는 행동을 하였다. 이는 랍비 문학과는 아주 거리가 먼 1세기 작가 필로와 요셉푸스의 반영되어 있는 성전 제의에 대한 존중과는 정반대가 되는 행동이다. 어떻게 제물을 바칠 것인가에 관한 논쟁은 익히 잘 알려져 있었다 (m. ?eqal. 3.3). 이러한 점은 마가가 예수의 성전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을 현실을 초월하고 있는 듯이 보이게 만든다.

더구나 예루살렘이 관여하기 전에 지방에서 환전하는 일들이 가동되기 시작되었기 때문에(m. ?eqal. 1.3), 성전에서 개입한다고 해도 반 세겔 징수를 막지는 못했을 것이다. 키케로 (Pro Flacco)는 기원전 59년에 디아스포라에서 성전세를 징수하여 모아둔 회당을 약탈한 한 의뢰인의 변호에 친히 전념한 경험이 있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가의 논평을 곁들인 설명은 유대교에 대한 그러한 공격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으며, 초기 독자들과 청중들은 이 장면이 반세겔 성전세 징수를 언급한다고 분명히 이해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복음서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세가 징수되었던 조건을 정확하거나 그럴듯하게 표현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수의 행동이 특정하게 반 세겔 징수를 겨낭하고 있지 않다면, 그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세금의 징수와 더불어, 성전은 또한 도장이나 보증 징표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수용하고 있었다 (m. ?eqal. 5.3?4). 이 정도까지는 마가에 나타난 예수 행동을 위한 무대 설정은 결국 그럴듯해 보인다.

희생 동물 판매상들이 있어야 할 위치 자체는 보통 감람산에 있었다 (Josephus, J.W. 5.504?5; y.Ta?an. 7.4)에 있었다. 그리고 미쉬나의 성전세에 관한 논고 (?eqalim) 자체는 희생 제사가 성전의 큰 뜰 (Great Court)에서 제물을 직접 구매할 수 없었음을 가정하고 있다 (m. ?eq. 5.3?4). 동물 판매상들이 실제로 큰 뜰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배열을 하였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바벨론 탈무드 (b.?Abod. Zar. 8b)에 따르면, 주후 30년경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실제로 급격한 변화를 일으켰다: "성전이 파괴되기 40년 전에, 산헤드린은 성전에서 쫒겨나서 그 회기를 가판대에서 열었다." [영어로 가장 영향력 있는 번안은 Epstein, Babylonian Talmud와 Jacob Neusner, The Talmud of Babylonia: An American Translation (Brown Judaic Studies; Chico, CA: Scholars Press, 1984?94)을 참고.] 성전에서 하누트 (아람어로 '시장 노점'을 뜻하는 단어)로 산헤드린을 추방하게 만든 상대는 무엇인가? 바로 이것에 마가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성전에 하누스로 축출하는 상대는 마크가 주목하는 바, 즉 신전에 거래를 도입하는 것이다. 예수는 탈무드의 관심사인 산헤드린 추방보다는 희생제사로 바쳐질 동물들의 매매 장소가 새롭게 설정되었다는 점에 항의를 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Baba ben Buta - Wikipedia
Baba ben Buta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Baba ben Buta ( Hebrew : ??? ?? ???? ) was a Jewish sage who lived at the time of Herod the Great , who is mentioned in the Talmud . Biography [ edit ] He may have been a member of the prominent family known as The Sons of Baba ("Bnei Baba"), who, ...
en.wikipedia.org
예수의 항의는 예언적인 용어로 묘사되어 있으며 (사 56:7; 렘 7:11), 무화과 나무의 상징성을 통합하고 있다 (잠 27:18; b.?Erub. 54a?b). 성전에 대한 공공연한 공격이 아닌 수준에서 무력 사용은 t. ?ag 2.11에 선례가 있다 (Neusner, Tosefta 참조). 부타의 아들 바바 (Baba ben Buta)라는 랍비가 예루살렘의 높은 가격에 항의하기 위해 동물들을 성전으로 몰아내고 무료로 제공했다. 스가랴 탈굼의 마지막 장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비유대인들 양측 모두가 초막절 (Sukkoth) 희생 제물을 성전에서 바칠 때에야,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예언한다. 더 나아가 이들 예배자들이 중간 매개인의 개입 없이 스스로 희생제사를 준비하고 바칠 것이라고 예견한다 (Targum Zech. 14.21). 탈굼 예언이 정곡을 찌르고 있는 요지는 예수가 성전에서 도발한 극적인 대립을 불러왔고, 마가는 본문의 수면 아래에서 이러한 상황을 회상하도록 기억을 위한 실마리를 놓아둔다. 예수의 행동은 권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바로 이것이 마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지점이다.
바울의 우상에 관한 교훈
예수의 사례와는 달리, 사도행전 22장 3절은 바울을 대신하여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그가 공부하였다고 직접 주장한다. 가말리엘은 힐렐을 계승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바리새파 원로에 해당하는 중요한 인물이다. 바울은 자신을 바리새파라고 밝히고 있다 (빌 3.5). 하지만 가말리엘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 그가 직접 개인적으로 이 현자와 함께 공부했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들은 동시대의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의 가르침을 비교할 차례가 됐다.
우상숭배의 논점은 가말리엘과 바울 사이의 입장을 대조보다는 유추하도록 만든다. 바울의 원칙은 간단하다: "세상에 우상이 없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은 없다" (고전 8:4). 그러므로 우상에게 음식을 바치는 개념상의 희생 제사 (행 15:19-21에 인용된 야고보의 입장에 반함)은 요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 원칙이 내포하고 있는 행동의 자유가 동료 신도로 하여금 소신이 없이 흔들리도록 만든다면, 바울은 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 편을 택할 것이라고 말한다 (고전 8:13; 참고. 롬. 14:13, 20).

이 원칙에 대한 바울의 진술이 함축하는 주안점이 있다. 혹자는 바울의 원칙이 판에 박힌듯한 바리새파의 의견과 조화되지 못한다고 예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말리엘의 견해는 요지가 무엇인가 보다는 분노의 결렬함이 어느 정도인가에 있어서 대조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m.?Abod.Zar. 3.4):
펠로세포스의 아들 페로클로스는 아코 (Akko)에서 라반 (랍비의 수장) 가말리엘이 아프로디테의 목욕탕에서 씻고 있었을 때 그에게 물었다. `당신의 토라에 기록되기를, '너는 봉헌된 것 (즉 진멸할 물건)을 조금이라도 손을 대지 말라' (신 13.17)고 하였습니다. 아프로디테의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으니 어찐 일인지요?" 그는 "목욕탕에서는 대답하지 않는다"고 그에게 말했다. 그가 밖으로 나가자,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녀의 영역에 결코 들어온 적이 없다. 그녀가 내 영역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아프로디테의 장식품으로 목욕탕을 만들자'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아프로디테를 목욕탕의 장식품으로 만들자'고 말한다. 또 다른 설명이 있다: 누군가 당신에게 많은 돈을 주었더라도, 당신은 결코 알몸으로 우상의 신전에 걸어 들어가지 않거나 끊임 없는 변화를 겪지 않을 듯이 보입니다. 또는 그 신전 안에서는 소변을 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시궁창 맨 앞에 서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녀 앞에서 오줌을 누고 있다. 오직 '. . . 그들의 신들' [신 12:3] 이라고만 말한다. 신으로 취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신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은 허용된다.

가말리엘이 아프로디테를 무시하는 것은 바울이 전체 우상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지만, 바울은 그 원칙을 표현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더욱 신중하다. 어째튼 바울은 우상들을 적극적으로 숭배하여왔던 몇몇 사람들을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말리엘의 노선을 따르는 입장이 널리 받아들여진 것처럼, 바울이 우상들은 별 볼일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견해를 단순지 주장하고 있다는 점만은 가히 주목할 만하다.
신약과 또 다른 유대 자료들이 거의 같은 것에 대해 말한다면, 같은 이슈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는 마치 논증을 하는 것처럼, 더 이상 숙고하지 않고 대조되기만 한다. 예를 들어, 20세기 마지막 사분기까지, 신약 학계는 유다 자료들에서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예수의 가르침에서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아주 다른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이 틀림이 없다고 널리 간주하여 왔다. 전자는 법의 문제, 후자는 은혜의 문제를 말한다고 보았다. 어떤 자료가 말하도록 허용하기 이전에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탈굼 요나단은 예수의 용법에 버금가는 종말론적 의미를 지닌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나라'이라는 표현을 예수의 용법과 견줄 수 있도록 집요하게 종말론족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의 의견이 수정되어왔다. 왕으로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많은 랍비 비유들은 예수를 전복적인 스승으로 쉽게 특성화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태도임을 증명하여 준다. 자기 재산을 종들과 함께 남겨두고 떠났던 왕이 돌아와서, 이들 종들이 서로 너무 사취하여왔음을 발견하고는, 도시의 성벽 밖에서 가난하고 헐벗은 채로 남겨두었다 (참조. Rabbi Nathan in the Sema?ot de Rabbi ?iyya 3). 예수는 이렇게 초현실적인 비유를 결코 말 한적이 없다.
성전에서 상인을 내쫓는 예수의 행동은 양을 성전으로 몰아가서 누구든지 자신에게 적합하게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공하였던 부타의 아들 바바의 행동 (b. Be?ah 20a?b)이라는 공통의 맥락에서 확실하게 밝히 드러난다. 그러나 그러한 공통된 맥락으로 인해, 둘 사이에 정결에 대한 이해가 동일하다거나 정반대가 된다고 되는 이해를 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으로 다시 한번 지적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다. 마 15:3?9와 막 7:6?13에 등장하는 고르반 맹세는 미쉬나에 동일한 서약을 언급하는 공통된 참고사항(tractate Nedarim, 특히 9.1)으로 조명하면 유용하다. 미쉬나가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부모와 관련된 관습의 남용을 통제하는 데 관심을 기웅ㄹ이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우상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조차도, 랍비 문학과의 유비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Rabbinic Literature and the New Testament: What We Cannot Show, We Do Not Know
Rabbinic Literature and the New Testament: What We Cannot Show, We Do Not Know
www.amazon.com
신약학을 위한 추론
신약과 랍비 문헌을 비교하여 읽을 때에, 우리가 직면하는 더 넓은 문제는 출처가 펼쳐지는 방식이다. 그러한 발전은 쟁점이 되는 듯이 보이는 유비의 유류에 관하여 우선적 엄청나게 명료하도록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왜 쟁점이 되는지도 밝혀 줄 수 있다.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랍비 자료의 문학적 맥락이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고려해야만 한다. 특히 연대 문제에 관한 한, 정확성과 특정성이 훨씬 높아야 한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우리는 본문과 자료들이 생산되었던 계기와 관련하여 추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 자료들이 예수나 바울이거나 심지어 신약이 밝히 드러내지 않는 다른 전승 전달자들이나 저자들에게서 유라햐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랍비 문학은 이러한 과정의 맥락을 이해하는 하나의 자료일뿐이다. 하지만, 과정 자체의 성격에 대한 유비점들을 제공한다.
blog.naver.com/poongkyung
'성경과 신학 1'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오순절 메시지: 피조물의 탄식을 들을 수 있을까? (0) | 2021.05.23 |
|---|---|
| 필로와 신약성서 (Philo and the New Testament) (0) | 2021.05.22 |
| 신약에 나타난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종말론 (0) | 2021.05.18 |
| 예수와 성전 -김세윤교수 (0) | 2021.05.17 |
| 예수는 과연 어떤 메시야인가 ?김 세 윤 교수 (0) | 2021.05.17 |



